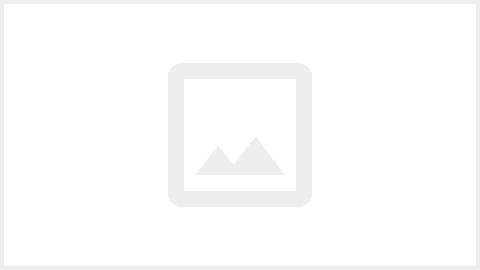그랜드 캐년과 여행
- 가본 곳&가보고 싶은곳
- 2014. 4. 11. 14:40
개인적으로 여행은 무언가 '새로운걸 배우기 위한 노력' 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서 무얼 배우느냐는 결국 자신의 관심사와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짜장면을 먹으러 중국에 가거나, 밀면을 먹으로 부산에 가는 것도 여행이고,
에펠 탑을 보러 파리에 가는 것도 여행이지만,
사실 영화를 보러 집 앞 극장에 가는 것도 여행이다.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은 극장의 디자인을 볼 것이고,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은 극장의 운영 방식이나 마케팅을 고민해볼 것이고,
컴퓨터를 공부한 사람은 예매 시스템을, 의류를 전공한 사람은 극장 방문자들의 패션을 보겠지...
각자 다른 관점에서 각자 다른 목적으로 새로운 사물을 관찰하려는 것,
그래서 기존의 생각이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 결국 여행의 목적 아닐까...
나는 어릴때 봤던 책에 실린 사진 때문인지, 전부터 '그랜드 캐년' 에 한 번 가보고 싶었다.
이름 그대로 '그랜드' 한 협곡을 직접 보고나면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전에는 여행은 '인간을 배우기 위한 여행' 과 '자연을 배우기 위한 여행'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어떻게 자 대고 자르듯 잘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간이 개입한 자
연'을 보게 되겠지만... 결국 나의 관점에서 보는 자연 역시도, 나 라는 인간의 개입해 버린건데... 그래도
유럽의 도시를 여행하거나, 라스베가스나 홍콩 같은 번화가를 여행하는데서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아마도 그랜드 캐년이나, 지난번 올린 우유니 사막에서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인간의 위대한 번성'이 아니라, '위대한 자연의 모습' 이랄까...? 좀 많이 유치하다.
하지만 막상 그랜드 캐년에 간다고 해도,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진 정도의 시야가 아닐까 싶다.
협곡 사이 사이를 모두 다 돌아다니며 관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다.
관광코스로 소개된 길 몇 개를 지나며 '우와~ 엄청나다~ 지구에 이런 곳이 있다니' 소리를 두 세번 하고
나면, 어느새 지겨워지고 다리 아파서 얼른 숙소로 돌아가야 겠다 생각을 하고말지 않을까...?
가끔 생각해보면, 오히려 실물보다 사진이 더 큰 아우라를 갖는 것만 같은 느낌이다.
안락함 속에서 관찰의 주체가 되었을 때와, 그 거칠거칠함을 몸소 체험할 때 느끼는 감각은
서로 다른게 당연하겠지...
하지만 '감상'이라는건 항상 뒤늦게 찾아오는 것이어서, 숙소에 돌아와 편히 누워 생각해 보면
'참 좋았다...' 싶을거다. 그리고 언제 다시 가볼 수 있을까? 라는 기약 없는 아쉬움이 그 감상을
특별하게 포장해 주는 거겠지...
어쩌면 그랜드 캐년에 간다는건, 북한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정도의
즐거움을 줄지도 모른다. 눈에 보이는 풍경이라는건, 내 눈보다 시력 좋은 카메라가 더 멋지게 담아낼
테니까... 하지만 그 곳에 찾아가는 동안, 사진 속 풍경을 내 눈으로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비행기 표를 사고, 숙소를 잡고, 낯선 곳을 헤메는 동안 내가 한 생각과 느낌, 그러한 경험들은
인터넷에 떠있는 사진을 볼 때는 얻을 수 없는 것일 테니까...
결국 '자연을 배우는 여행'도 그 자연을 보러 가며, 그리고 보고 난 이후, 내가 했던 생각이나 느꼈던
느낌, 그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무언가를 배우러 가는 과정이 아닐까? 마치 '인간을 배우는 여행'이
다른 언어 다른 문화와 음식을 통해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과정인것 처럼 말이다.
아마도 여행은 어디를 가도 새로운걸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여행일 것이다.
다만 필요와 취향에 따라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 뿐이겠지...
'가본 곳&가보고 싶은곳'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900원짜리 짜장면! 북경짜장면 후기! (0) | 2018.08.13 |
|---|---|
| 커피를 마시면 '고전 게임'을 할 수 있는, 국제전자상가 옆 '레트로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0) | 2015.01.20 |
| 자전거 타고 '하프코스' 다녀왔습니다. (0) | 2014.07.10 |
| 볼리비아 의 우유니 사막. (0) | 2014.04.09 |
이 글을 공유하기